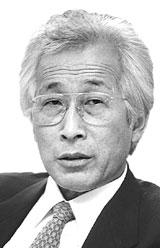
- ▲ 박성조 베를린자유대 종신 정교수동아대 석좌교수
둘째, 복수노조 기업의 생산성이 단수노조 기업보다 낮고, 임금수준도 낮아 노동자들이 복수노조 기업을 기피한 것도 복수노조를 쇠퇴시켰다.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잦은 파업, 신규 조합원의 스카우트 경쟁, 기업 내 세력확장 경쟁, 단체교섭에서의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한 과도경쟁 등으로 막대한 시간적·재정적 비용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투자도 복수노조기업보다는 단수노조기업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영국 상무성 조사에 따르면 최근 25년간 녹지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장 대부분이 단수노조 사업장이었다.
셋째, 다국적기업들도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에는 투자를 기피해 왔다. 영국은 대처 총리 이후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강성노조 퇴출과 함께 세계 각국의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해 왔다. 다국적기업들은 단일 노조·무파업 지역을 선호하며, 심지어 영국과 아일랜드에 단일노조와 무노조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전략, 즉 병행관리형(double breasting)을 구사하기도 한다.
넷째,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는 복수노조, 노조의 니즈 자체를 현격히 감소시켰다. 세계화, 정보화, 시장 단일화의 지식경제시대로 접어들면서 EU 27개국 총 노동인구의 17%가 지식노동자다. 이들에게는 산업화 시대의 연대정신과 계급투쟁적 구호와 행동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노조로는 더 이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서유럽 국가에서는 이처럼 복수노조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으나, 이제 막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동유럽 국가에서는 복수노조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도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나의 척도가 복수노조로 이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금년에 G20 정상회의를 유치해 명실공히 선진국가로 진입했다고 들떠 있다. 그러면서 동유럽 국가에서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복수노조를 시행한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수노조 시행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선진화이다.
독일에서 한때 '자본 없는 자본주의, 노조 없는 노조시대'가 왔다고 했다. 이 말의 의미는 '독일의 기업인들이 (노조 때문에) 점차 외국에 투자하고, 노조는 노조원이 감소하여, 노조 간부만 남는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겐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줄이려면 노사관계 안정, 선진화가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작금의 논의는 노동관계 법령의 선진화와 더불어 노사관계 안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복수노조를 도입할 경우, 수년간에 걸친 현장의 노조 난립과 그로 인한 노노갈등 증폭과 조직문화 파괴, 경영상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의명분을 위하여 서구지역 국가에서 시들해지고 있는 복수노조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되살아나는 국가경제 회생의 불씨를 죽여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