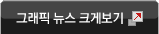입력 : 2013.10.02 03:08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 정부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어 새로운 60년을 기약하고 있지만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재연기, 미사일 방어(MD) 참여,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①韓은 안보 불안, 美는 돈 때문에… 전작권 연기 갈등
[전시작전통제권] 美일각, 韓 안보무임승차 제기… WP "美 관료들, 한국에 실망"
미 워싱턴포스트는 30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 관리들이 올여름부터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관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일부는 한국이 자신의 국방을 책임지기를 꺼리고 있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올 초 미 측에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미 측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여건 등을 고려한 전작권 전환의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2015년 전작권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국방부는 2일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재연기에 합의할 것을 희망했으나,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고 밝혀 이번 SCM 때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지난 수년간 한반도 안보 환경이 악화됐고 한국군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연기 이유로 들고 있다. 미 측은 ‘시퀘스터’(연방 예산 자동삭감) 등으로 국방비를 대규모로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은 특히 한국 측에 ‘안보 무임승차(無賃乘車)’라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될 경우 정보 감시 정찰 및 정밀타격, 미사일 방어 등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②韓 "MD, 우리 여건엔 너무 사치스러운 무기"
[미사일방어 체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SCM 참석을 앞두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을 묻는 질문에 “미사일 방어(MD)는 명백하게 한국군 역량의 커다란 부분”이라고 밝혔다. 작년 SCM 당시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미국과 한국이 (미래 MD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올해에도 미 국방장관이 나서 한국의 MD 참여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지난 30일 “북한 탄도미사일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공동 통합 미사일 방어 체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①韓은 안보 불안, 美는 돈 때문에… 전작권 연기 갈등
[전시작전통제권] 美일각, 韓 안보무임승차 제기… WP "美 관료들, 한국에 실망"
미 워싱턴포스트는 30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 관리들이 올여름부터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관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일부는 한국이 자신의 국방을 책임지기를 꺼리고 있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올 초 미 측에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미 측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여건 등을 고려한 전작권 전환의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2015년 전작권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국방부는 2일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재연기에 합의할 것을 희망했으나,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고 밝혀 이번 SCM 때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지난 수년간 한반도 안보 환경이 악화됐고 한국군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연기 이유로 들고 있다. 미 측은 ‘시퀘스터’(연방 예산 자동삭감) 등으로 국방비를 대규모로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은 특히 한국 측에 ‘안보 무임승차(無賃乘車)’라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될 경우 정보 감시 정찰 및 정밀타격, 미사일 방어 등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②韓 "MD, 우리 여건엔 너무 사치스러운 무기"
[미사일방어 체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SCM 참석을 앞두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을 묻는 질문에 “미사일 방어(MD)는 명백하게 한국군 역량의 커다란 부분”이라고 밝혔다. 작년 SCM 당시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미국과 한국이 (미래 MD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올해에도 미 국방장관이 나서 한국의 MD 참여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지난 30일 “북한 탄도미사일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공동 통합 미사일 방어 체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는 MD와 다르다”며 공식 부인하고 있으나, 미 측은 우리 정부에 MD 참여를 여러 경로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은 한반도 여건상 MD는 너무 ‘사치스러운 무기’이기 때문에 훨씬 돈이 적게 드는 KAMD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은 MD 참여에 따르는 비용 문제 외에도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 소극적인 입장이다.
③日, 군국 치닫는데… 美, 韓·日 안보 협력 요구
[동북아 안보 '일본 딜레마']
미국은 오랫동안 한·미·일을 연결하는 삼각 안보 체제 구축을 구상해 왔다.
방한 중인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일 3자 안보관계를 구축하려면 한·일 간 현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이는 번번이 한국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가장 단적인 예가 작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통과 논란’이다. 우리 정부는 작년 4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본과 가서명한 후, 이를 공표하지 않고 6월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켰으나 서명 직전 사실이 알려져 결국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랄프 코사 연구원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하고는 잘 협력하는데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④韓 "핵폐기물 재처리권 달라"… 美는 꿈쩍안해
[원자력협정 개정]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를 수석 대표로 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8차 협상을 벌였다.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현행 협정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3개월마다 협상하기로 한 뒤 연 두 번째 협상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부터 양국 간 3대 핵심 쟁점인 △사용후핵폐기물 재활용 △원전 연료 안정적 공급 △수출 경쟁력 확보 등으로 갈래를 나눠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7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서 만나 원자력협정 개정을 “동맹 정신에 기초하여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사용후핵폐기물의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미국 측 인사들은 최근 한국 인사들을 만나 “미국이 급할 것이 없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동맹 관계를 훼손할 것을 우려했던 미국이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면서 최근 강경한 기존 태도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⑤韓 "美軍주둔비 줄여야" 美는 "1조원代 올려야"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미가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현재 양국 간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현행 협정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달까지는 협상을 타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4차례 협상했지만 제도 개선, 분담금 총액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미군은 한국이 인건비·군수지원·군사건설 등 큰 항목으로 제공하는 돈과 현물을 미군이 원하는 시기와 항목에 쓸 수 있다. 그해 다 쓰지 못하는 돈을 이듬해 쓰는 경우도 있어 이월(移越)을 금지한 우리 정부 예산 회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분담금 총액에서도 우리 측은 2013년 기준 8695억원에서 감액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국은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해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MD 참여에 따르는 비용 문제 외에도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 소극적인 입장이다.
③日, 군국 치닫는데… 美, 韓·日 안보 협력 요구
[동북아 안보 '일본 딜레마']
미국은 오랫동안 한·미·일을 연결하는 삼각 안보 체제 구축을 구상해 왔다.
방한 중인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일 3자 안보관계를 구축하려면 한·일 간 현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이는 번번이 한국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가장 단적인 예가 작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통과 논란’이다. 우리 정부는 작년 4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본과 가서명한 후, 이를 공표하지 않고 6월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켰으나 서명 직전 사실이 알려져 결국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랄프 코사 연구원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하고는 잘 협력하는데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④韓 "핵폐기물 재처리권 달라"… 美는 꿈쩍안해
[원자력협정 개정]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를 수석 대표로 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8차 협상을 벌였다.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현행 협정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3개월마다 협상하기로 한 뒤 연 두 번째 협상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부터 양국 간 3대 핵심 쟁점인 △사용후핵폐기물 재활용 △원전 연료 안정적 공급 △수출 경쟁력 확보 등으로 갈래를 나눠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7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서 만나 원자력협정 개정을 “동맹 정신에 기초하여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사용후핵폐기물의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미국 측 인사들은 최근 한국 인사들을 만나 “미국이 급할 것이 없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동맹 관계를 훼손할 것을 우려했던 미국이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면서 최근 강경한 기존 태도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⑤韓 "美軍주둔비 줄여야" 美는 "1조원代 올려야"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미가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현재 양국 간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현행 협정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달까지는 협상을 타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4차례 협상했지만 제도 개선, 분담금 총액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미군은 한국이 인건비·군수지원·군사건설 등 큰 항목으로 제공하는 돈과 현물을 미군이 원하는 시기와 항목에 쓸 수 있다. 그해 다 쓰지 못하는 돈을 이듬해 쓰는 경우도 있어 이월(移越)을 금지한 우리 정부 예산 회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분담금 총액에서도 우리 측은 2013년 기준 8695억원에서 감액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국은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해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크게 작게
작게



 요즘
요즘 싸이 공감
싸이 공감 MSN 메신저
MSN 메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