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2월 28일,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선언서' 인쇄를 마친 뒤 긴급 회의를 열었다. 다음 날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열기로 한 독립선언식 장소를 실내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파고다공원에서 학생들 만세 집회가 예정돼 있어 자칫 폭력적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3·1 운동 발원지는 종로 태화관이 됐다.
▶조선일보가 서울 인사동 옛 태화관 자리 앞을 지나가던 시민 100명에게 3·1 운동과 관련한 질문 4개를 물었는데 모두 정확히 답한 사람은 9명에 불과했다. 9명은 모두 50대 이상이었다. 한 문제도 대답하지 못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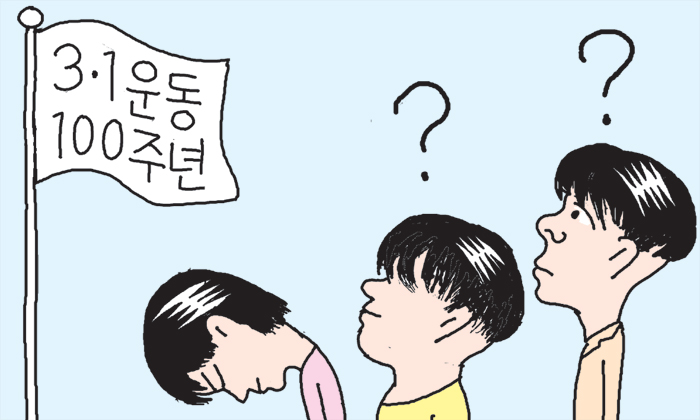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해 일제에 붙잡힌 안중근, 3·1 독립선언 후 고향에 내려가 4월 1일 만세운동을 벌인 유관순을 '민족대표 33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원래 삼일절은 삼삼절이 될 뻔했다. 독립선언식을 고종 국장(國葬)일인 3월 3일로 예정했다가 하루 앞당기려 했으나 일요일이어서 1일이 됐다. 모두가 그런 사실까지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시중에는 삼일절을 조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로 알고 있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한다.
▶몇 년 전에는 인터넷 한국사(史) 강사라는 사람이 3·1 독립선언을 "룸살롱에서 술판 벌인 것"이라는 식으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람은 "민족대표 33인보다 학생과 일반 대중이 만세운동을 이끌었다는 걸 강조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북한도 3·1 독립선언을 "투항주의 분자들이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헛된 기대를 걸고 청탁과 구걸로 독립을 이룩해 보려고 벌였던 먹자판"이라고 폄훼한다.
▶열 명 중 아홉이 독립선언의 발원지 등 3·1 운동의 기본 사실들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는 기사를 읽으며 부실한 역사 교육을 새삼 생각한다. 3·1 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와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임정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