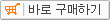- ▲
데드라인에 선 기후|프레드 피어스 지음|김혜원 옮김|
에코리브르|382쪽|1만8000원
전 세계 환경론자들은 2007년을 가슴 벅차게 마감했다. 영화 《불편한 진실》로 지구온난화가 파괴적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주창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유엔 산하 협의체인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IPCC)이 그해 10월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경제성장론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여오던 환경론자들로선, 대중성(고어)과 학문적 영역(IPCC)에서 동시에 승리의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짜릿한 감동을 맛봤던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환경론자의 사기극'으로 몰아붙이던 사람들은 노벨상의 권위에 눌려 한순간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반면, IPCC는 그해 11월 한걸음 더 나아갔다. 130개국, 2500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기후변화가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경고의 강도를 한껏 높인 것이다.
수년 전부터 세계인을 불안에 떨게 한 해수면(海水面) 상승 전망도 마찬가지였다. 2100년이면 전 세계 해수면이 지금보다 18~59㎝ 상승할 것이라던 불과 9개월 전의 전망을 "상승폭을 가늠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바꾸었다. "해수면이 최소 1m는 상승할 것" "온실가스를 내뿜는 사람의 활동이 결국 인류 자신의 삶의 토대를 뒤흔들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도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그 결과,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어두운 미래가 이제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환경운동단체‘지구 유럽의 친구들3이 지난 3월 12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 본부에서 지구온난화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 회원이 펭귄 복 장을 한 채 냉장고 안에 앉아‘시원한 곳이라고는 냉장고만 남았나?'라고 적힌 피켓 을 들고 있다./AFP
《데드라인에 선 기후》는 여기서 다시 한 발짝을 내디딘 책이다. 정색하고서 "그런 상식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국의 과학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의 기자와 편집자로 20여년 기후변화 문제를 파헤쳐온 저자는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환경저널리스트다운 방식으로 '진실'을 설파한다. 지구 구석구석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며 "알면 알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파괴적 미래가) 더 두려워진다"는 고백도 거듭 내놓는다.
공포감의 실체는 북극과 남극, 해양, 시베리아, 열대우림(雨林) 등 대체로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웅크리고 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만년빙(�H)에, 우림 토양 속에, 그리고 북극 툰드라 지역에 '원시적인 힘'들이 숨어 있고, 지금보다 기온이 조금만 더 높아지면 이곳의 '괴물'들이 완전히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극의 그린란드로 가보자. 남극대륙의 두곳과 함께 세계 3대 빙상(氷床·대륙을 뒤덮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 가운데 하나인 그린란드는, 눈이 많게는 3㎞가량 높이의 얼음으로 압축된 거대한 얼음대륙이다. 그런데 바위보다 단단한 이곳의 얼음 덩어리 상부(上部)가 곳곳에서 크게는 지름 6㎞가량의 호수로 이미 변했거나 변해가고 있다.
문제는 그 채워진 물이 얼음의 갈라진 틈을 찾아 3㎞ 높이의 폭포처럼 얼음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린란드 현장에서 십수년째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빙상의 바닥에 이미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을지 모른다"고 전한다.
그린란드의 빙상이 모두 녹으면 지구상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7m까지 상승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다. 공상과학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저자는 여러 과학적 근거를 들며 "그린란드 빙상의 붕괴는 매우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남극대륙의 빙상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이 밖에 아마존 우림 지대가 기록적인 이상 가뭄이 닥친 1998년 이후 어떻게 변했고, 그 후유증은 무엇인지 등 다른 '괴물'들이 가까운 장래에 깨어날 수 있다는 징후도 실감 나게 그리고 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등을 쉽게 설명한 것도 장점이다.
이 책은 그러나 '지구온난화 논쟁'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종식시킬 정도로 명료한 논리를 대거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상황의 '원인'에 대해선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기후변화의 결과로 깨어나게 될 '괴물'들의 출현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근심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태양 흑점(黑點)의 활동이든, 궤도진동이든, 인간의 파괴이든 (상관없이) 자연은 압력을 받으면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라는 식이다.
지나친 신경과민이 건강에 좋을 리 없다. 좀 더 온건한 톤으로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을 파헤친 책으로는, 팀 플래너리의 《기후창조자》(황금나침반)나 슈테판 람슈토르프의 《미친 기후를 이해하는 짧지만 충분한 보고서》(도솔) 등이 있다. 균형 감각을 갖추기 위해 반대쪽 주장을 알고 싶다면 비외른 롬보르의 《회의적 환경주의자》(에코르브르)나 《쿨잇》(살림출판사) 혹은 로이 스펜서의 《기후 커넥션》(비아북)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