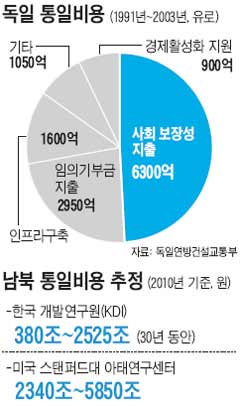[下] 가해자와 피해자
"인구 6분의 1이 스파이 활동"
범죄 청산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연금 더 받고 잘살아…
화합·통합 원칙 내세우면서
가해자들 처벌 뒷전 밀린 탓
독일 통일 20주년. 그러나 상처는 깊고 분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달 22일 독일 북부 니더작센주(州). 슈타지(옛 동독 비밀경찰) 범죄 피해자들은 정부가 보상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동독 공산독재 정권 시절 고문·감금 등 인권유린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30일 베를린 슈타지 문서관리청 로비에서 만난 스티르느 피셔(52)씨는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이 아직도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걸 참을 수 없다"면서 "가해자들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2008년부터 동독 공산독재 치하에서 6개월 이상 감옥에 수감됐던 정치범 중 월소득이 1388유로(약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에게 월 250유로(38만원)의 피해자 보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약 4만3000명이 이 수당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지급 대상을 저소득자에게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피해자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슈타지 비밀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연방 슈타지 문서관리청에는 슈타지 비밀요원들이 작성한 개인 감시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문서를 일렬로 이으면 길이가 160㎞에 달할 정도다. 옛 동독지역 지방 정부·경찰서 문서고 등에서 관련 서류가 속속 추가 발굴되면서 슈타지의 비밀문서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슈타지박물관에서 만난 슈테펜 라이데 학예사는 "심지어 한 사람의 동태감시 보고서를 쌓아 놓으면 높이가 14m에 이르는 인물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슈타지의 감시대상 인원은 250만명. 당시 동독 인구(1800만명)를 감안하면 인구 7명 중 1명이 감시를 당한 셈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슈타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4만3000명으로 전체의 2%도 안 된다.

- ▲ 대형 벽화가 그려져‘동쪽 갤러리’로 불리는 독일 옛 베를린 장벽의 최근 모습. 장벽은 새로 단장됐지만 옛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당시 동독 사람들은 7명 중 1명꼴로 슈타지의 감시를 당했지만, 이들 가운데 피해 사실이 입증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2%도 안 된다. /Gettyimages멀티비츠
통일 후 슈타지의 비밀문서가 속속 공개되면서 옛 동독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웃, 친지, 심지어 남편, 아내까지 슈타지의 비밀정보원 노릇을 하며 자신을 배반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니더작센주 슈타지피해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하르무트 뷰트너 전 기독민주당 의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전 피해자로 확대해도 총 지급액은 연간 1억유로(15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공산정권 시절 가해자들은 그보다 3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즐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슈타지 비밀정보원의 총인원이 얼마인지는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최소 18만9000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인구 6명당 1명이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보도(영국 BBC방송)도 나왔다.
슈타지의 감시와 불법감금, 고문에 치를 떨던 동독 주민들은 베를린장벽 붕괴 후 가장 먼저 슈타지 본부를 습격해 비밀문서부터 확보했다. 통일 독일 정부는 슈타지 문서가 전면 공개될 경우 개인 간 피의 보복사태가 벌어져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공개를 꺼렸다. 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전면 공개' 요구가 빗발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로 부각됐다. 라이데 학예사는 "'모두 없애버리자', '30년간 공개를 금지시키자', '자기 문서만 볼 수 있게 하자'는 3가지 의견이 대립했는데 피해자에 한해 자기 문서만 열람을 허용하는 '제한 공개'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서량이 워낙 방대한 탓에 관련 서류를 찾는 데만 2년 이상 걸리기도 해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 당시 동독 주민들로부터 '제1의 공적'으로 꼽히며 원성의 대상이 됐던 슈타지의 최고 책임자 에리히 밀케에 대한 단죄 역시 그가 자연사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됐다. 그는 재판정에서 1931년 좌익 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2명의 우익 인사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6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년 후 병보석으로 풀려난 뒤 2000년 노환으로 숨졌다. 독재청산재단에서 만난 칼 오토(59)씨는 "이렇게 죗값을 치르지 않고 사라지는 사람이 한 해에도 수백명씩 될 것"이라고 말했다.
냉전 시절 베를린장벽을 넘던 동독 주민들을 100여명 이상 사살했던 동독 국경수비대 군인들도 별도 처벌은 받지 않았다. 통일 후 과거 청산은 '처벌'보다는 '화해와 통합'을 원칙으로 했다. 가해자 처벌과 구기득권 세력의 인적 청산은 최소화됐다. 하지만 공산독재 시절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는 넘쳐나는데 가해자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인 황당한 상황이 통일 이후에도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30일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의 로버트 그륀바움 사무처장 같은 전문가들에게 "역사상 최악의 반인권 범죄국가인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피해자의 보복으로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해법을 물었는데 나치와 구동독 공산 독재체제 청산 경험이 있는 그들조차 선뜻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