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천헌연도(獻宴圖)'에도 눈길이 멈춘다. 농암이 낙동강 지류 분천변에 애일당 짓고 부모 위해 베푼 잔치를 그렸다. '애일(愛日)'은 '하루를 아껴 효도한다'는 뜻이다. 농암은 일흔 넘도록 부모 앞에서 때때옷 입고 춤췄다. 잔치엔 동네 노인은 물론 여자·천민도 불러 대접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엔 선조 임금 글씨 '積善(적선)'이 있다. 농암의 베푸는 마음을 기려 써 보낸 어필(御筆)이다. 농암 집안 장수는 타고났겠지만 대 이은 덕행과 효도 덕도 클 것이다. 지금도 안동 농암 종택은 노부모 모시고 온 가족의 아침 밥값을 받지 않는다.
▶한림대 김용선 교수는 고려 묘비와 문헌을 조사해 고려 사람 평균 수명을 마흔으로 짐작했다. 고려 왕은 마흔두 살이었고 승려는 일흔에 이르렀다. 잘 먹고 편히 욕망 따라 사는 게 장수에 이롭지 않다는 얘기다. 조선시대에도 왕 평균 수명은 마흔여섯인 반면 청백리는 예순여덟이었다. 내시(內侍) 평균 수명이 일흔이었다는 연구도 있다. 거세돼 남성 호르몬이 끊긴 것이 장수 이유라고 했다.
▶18세기 실학자 성호 이익은 여든셋까지 살았다. 책 '노년의 풍경'은 그가 기름진 음식 대신 평생 거친 음식을 적게 먹은 덕분이라고 했다. 그가 늘그막에 '30년 전 일은 모두 기억해도 눈앞 일은 문득 잊어버린다'고 썼다. 지금 노인의 한숨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감탄스럽다. 그는 '요즘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젊은이가 노인을 능멸한다'고도 했다. 혀차는 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리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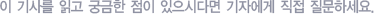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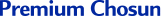





























![[만물상] 장수(長壽) 비결](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410/26/2014102602473_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