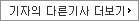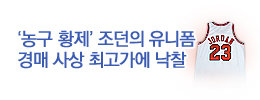권순활 논설위원
권순활 논설위원북한의 기적, 한국의 기적
한국의 후발 산업화는 정부가 주도해 민간과 손을 잡고 성공시킨 민관(民官) 합작, 더 엄밀히 말하면 관민 합작의 산물이었다. 기업인들의 역할도 컸지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공직자들의 혜안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코리안 미러클’ 1, 2권을 읽을 때마다 대한민국을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고뇌하고 번민한 선배 세대의 몸부림을 느낀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왜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빼고 20세기 역사를 논할 수 없다”고 평가했는지도 새삼 깨닫는다.
권당 600페이지에 가까운 ‘코리안 미러클’ 1∼3기 편찬위원장은 진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다. 모두 현재의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 경제팀 수장(首長)을 지낸 이들이다. 한국 산업화 혁명의 성과를 부정하는 데 집착하는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곤혹스러울지도 모른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정파를 떠나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한국인들이라면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이 편찬위원들의 면면에서도 드러난다.
‘코리안 미러클’이라면 당연히 한국의 기적을 가리킨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 표현이 50년 전 처음 나왔을 때는 사정이 달랐다.
로빈슨이 언급한 북한판 ‘코리안 미러클’은 지금 국제 학계에서 지식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쯤으로 치부된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진정한 경제기적인 한국판 코리안 미러클이 ‘과거 완료형’으로 끝날 위험성이 커진 우리 현실이다.
정치권의 후진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기업과 기업인들은 활기를 잃어가고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역량도 예전 같지 않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은 극단 세력의 폭력적 행태는 중진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아프게 일깨워준다.
‘코리안 미러클’ 실무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취재하기 위해 연락했을 때 그는 베트남 정부의 초청으로 출국하려고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던 중 전화를 받았다. 아직까지는 많은 신흥국이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과 경험을 배우려고 우리 전직 관료와 기업인들을 경쟁적으로 초청한다. 그러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요즘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한때 잘나갔다가 급속히 추락한 국가’라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대표적 모델로 해외에서 인용되지 않을까 두렵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