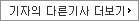최영해 논설위원
최영해 논설위원‘盧 보호 못했다’ 비판받아
2002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은 민정수석비서관에 문재인을 발탁해 고위직 인사검증과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업무를 맡겼다. 노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 청와대에서 문재인은 ‘왕(王)수석’으로 불렸다. 당시 문재인은 “앞으로도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하지만 부산에서 좋은 변호사로 불리던 문재인이 국정 전반을 살피는 민정수석 업무에선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호남에선 부산 출신들이 청와대 자리를 다 차지했다고 비난했고, 모교(母校)인 경남고 출신들은 동문도 챙기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노무현 청와대 마지막 해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은 문재인은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주변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비서실장이 대통령 퇴임 후 벌어질 일을 미리 챙기지 못해 노 대통령의 말로가 비참해졌다는 것이었다. 비서실장이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었지만 비난의 화살을 비켜가지 못했다.
노무현 청와대 5년,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문재인의 국정 경험은 이후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 됐을 것이다. 2009년 5월 갑작스러운 노무현의 서거는 정치에 관심 없다던 문재인의 정치적인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그럼에도 문재인이 여전히 친노(親盧) 친문(親文) 패권주의에 갇혀 있다는 당 안팎의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표의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문재인이 신동아 2월호 인터뷰에서 “친문 패권이란 말은 문재인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참모들에 대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이 뜰수록 제3지대의 화학적 결합도 거세지면서 대선판도 요동칠 것이다. 민정수석 때 맞지 않은 옷을 걸친 듯한 이미지가 지금 주변에 어른거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훌쩍 몸집이 커져 버린 문재인은 이제 친노 친문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버리고 넉넉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다. 중도층뿐 아니라 합리적 보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없으면 제자리걸음에 머물 뿐이다. 친박 패권주의가 하루아침에 폐족(廢族) 신세가 된 지금 친노 간판과 친문 패권주의만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최영해 논설위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