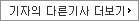2013년 공사를 시작해 지하 이전을 완료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내부(위 사진). 최종 준공을 앞두고 시범 가동 중으로 최대 하루 25만 t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9월이면 지상 공간도 공원 조성작업을 마무리하고 지역 주민에게 선을 보인다. 공원에는 잔디광장과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환경부 제공
2013년 공사를 시작해 지하 이전을 완료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내부(위 사진). 최종 준공을 앞두고 시범 가동 중으로 최대 하루 25만 t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9월이면 지상 공간도 공원 조성작업을 마무리하고 지역 주민에게 선을 보인다. 공원에는 잔디광장과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환경부 제공과거 하수처리시설은 대표적인 기피·혐오시설이었다. 1992년 지상에서 가동을 시작한 박달하수처리장도 군포 의왕 광명을 포함하는 일일 30만 t 규모의 안양시권 광역하수처리시설로 악취 민원이 잇따랐다. 고속철도(KTX) 광명역 역세권 개발이 시작되며 철거 요청까지 나왔고, 안양시와 광명시는 고민 끝에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기로 결정했다. 역세권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세하며 2008년 3218억 원 규모의 대공사가 시작됐다.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공사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시설을 한순간에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시설로 전환하는 기적을 시연했다. 하남 유니온파크가 대표적인 예다. 하수처리장이 지하로 몸을 숨긴 뒤 지상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재탄생했고, 악취를 정화해 내뿜는 굴뚝은 전망대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건너편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까지 들어서며 지역 관광과 상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 레스피아’ 등 비슷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박달하수처리장도 지상 공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과 편의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안양새물공원’으로 불릴 이 공간은 축구장 25개 면적인 18만 m²에 이른다. 야구장과 테니스장, 농구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시설과 잔디정원, 도시 숲 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하수처리시설도 지하로 이전하며 기존보다 기술과 장비를 더 보강했다. 조명을 달고 악취를 따로 정화해야 하는 등 지상에 있을 때보다 전력을 3배가량 더 소모하는 점을 감안해, 하수찌꺼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같은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구비했다. 연간 약 1만2000MWh의 전력(약 3000가구 연간 사용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규모다. 이를 통해 추가 전력사용량을 보전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만9502t의 온실가스도 저감하게 된다.
이번 공사의 발주를 맡은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 분야에서 과거 기피시설로만 여겨지던 환경기초시설이 님비 현상을 극복한 우수 사례로 국민 생활과 충분히 어우러질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역주민의 반대로 도심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던 이런 환경시설이 주민 가까이 위치하면서 거리에 따른 각종 기회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월경이면 지상의 모든 시설물 및 공원 조성 공사가 마무리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