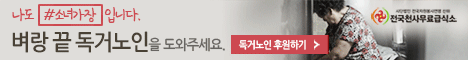임산물 재배는 환경도 중요하고 지역적 특성도 중요하다. 고도의 기술과 많은 경험을 요하는 임산물이 많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하는 작물들이 다르다. 대부분의 임산물은 밭에서 재배하는 농산물과 달리 5년 이상 관리하고 길러야 수확이 가능하다. 5년 동안 잡초, 물, 자연재해, 유해동물 등 갖가지 자연환경과 싸워서 이겨내야 자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최소한 5년이 지나야 그 결과물을 내준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출신 산채 전문가의 강의가 끝난 후 질문을 했다. “가장 게으른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임산물이 무엇입니까?” 그는 “산마늘(명이나물)”이라고 말했다.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고 유해동물 피해도 적고, 이른 봄에 제일 먼저 나왔다가 여름이면 들어가기 때문에 풀과의 전쟁도 비교적 쉽다고 한다. 잎이 좁고 향이 강한 오대산 종과 잎이 넓고 부드러운 울릉 종이 있는데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생채로서는 울릉산이 더 식감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시험 재배를 해보기로 했다. 재작년 10월 중순에 5년생 산마늘 모종 1000포기를 매입하여 해발 700m의 한쪽 기슭에 심었다. 겨울에 가볼 일이 없었다. 우선 춥기도 하고 겨우내 눈이 쌓여 있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듬해 3월 초순 식재해 둔 산마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산을 올라갔다. ‘말라 죽지는 않았을까?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이른 봄, 잿빛 숲속을 홀로 올라가는데 저기 멀리 초록색의 어린잎이 삐죽하고 나와 있었다. 내가 시험 삼아 심어 놓고 겨우내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내팽개치다시피 한 산마늘들이었다. 그런데 거의 1000포기가 다 살아 있는 듯했다.
뺨 위로 무엇인가 주르륵 흘렀다. 눈물이었다. 왜 눈물이 났을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명을 키워준 자연에 감동해서였을까.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 때문이었을까. 아예 비스듬히 누워 있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뿌리만 지면에 살짝 걸쳤는데도 살아남은 놈도 있었다. 대단한 생명력이다. 울릉도 사람들의 명을 이어 줬을 만한…. 과연 ‘명이나물’이다.



![[한국축구 톡톡]“축구 선수인지 연예인인지…”](http://dimg.donga.com/a/74/58/90/2/wps/NEWS/IMAGE/2017/09/15/86339043.1.jpg)











![[속보]합참 “北미사일, 비행거리 3700여㎞·비행고도770여㎞”](http://dimg.donga.com/a/74/58/90/2/wps/NEWS/IMAGE/2017/09/15/86340422.2.jpg)
![[속보] 한국당 혁신위, 朴 전대통령에 자진탈당 권고…서청원·최경환도](http://dimg.donga.com/a/74/58/90/2/wps/NEWS/IMAGE/2017/09/13/86302913.3.jpg)

![[오늘과 내일/정성희]북핵이 두렵나, 원전이 두렵나](http://dimg.donga.com/a/74/58/90/2/wps/NEWS/IMAGE/2017/09/15/86339118.1.jpg)

![[단독]“인터넷 마녀사냥 지옥 같았다… 밥 한끼 못먹고 잠 한숨 못자”](http://dimg.donga.com/a/74/58/90/2/wps/NEWS/IMAGE/2017/09/15/86338831.1.jpg)
![[오늘과 내일/최영해]부활하는 ‘노무현의 사람들’](http://dimg.donga.com/a/74/58/90/2/wps/NEWS/IMAGE/2017/09/14/8631786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