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곳이 사료 업계다. 한국펫사료협회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자가격 기준 7323억원 규모였던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2016년 9696억원으로 약 32% 성장했다. 연평균으로는 15%씩 성장한 셈이다.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적게는 1조원, 많게는 1조5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이 같은 성장세는 ‘반려동물의 인간화’에 기인한다.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을 사료가 아닌 ‘식품(Pet Food)’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다. 8세짜리 몰티즈 ‘루니’를 키우는 이민아(27)씨는 “외동딸로 자라 강아지를 데려올 때 동생을 입양하는 마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며 “내가 먹을 음식은 조금이라도 싼 것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하지만 루니에게는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 비싼 사료에 과감하게 지출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펫푸드 시장이 1조원짜리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기존 사료 업체는 물론 일반 식품 업체들도 전담 부서를 편성하고 전용 공장을 증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이어지고 있다. 오메가3, 홍삼 등 사람 몸에 좋다는 온갖 재료들이 반려동물 사료 원료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이씨는 최근 루니의 사료를 바꿨다. 대형마트에서 사서 먹이던 사료에 루니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루니는 프랑스 브랜드 로얄캐닌의 ‘몰티즈 어덜트’와 ‘하이포알러제닉 스몰독’을 섞어 먹고 있다. 각각 한 봉지에 2만원(내용물 중량 1.5kg), 6만원(3.5kg)씩 하는 사료들로, 모두 프랑스에서 수입된 것이다. 이외에도 이씨는 루니의 치아 건강을 위해 ‘웜지쓰 오래 씹는 천연 덴탈껌’을 사서 먹이고 있다.
이씨를 비롯한 한국 반려인들은 펫푸드 구입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 월평균 ‘20만원 미만’의 지출은 31.4%에서 20.2%로 감소했다. 반면 20만~50만원은 17.8%에서 20.9%로, 50만~100만원은 2.6%에서 8.7%로 증가했다. 특히 월 100만원 이상 쓰는 가구가 같은 기간 0.2%에서 9.0%로 크게 늘었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85.8%는 ‘사료와 간식비에 가장 많이 쓴다’고 답했다.
반려인들의 이 같은 수요에 힘입어 기업들은 프리미엄 펫푸드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프리미엄 반려견 건강간식 ‘지니펫 더스낵’을 출시했다. 지니펫 더스낵은 프랑스산 치즈와 청정 호주산 소고기에 6년근 홍삼성분을 더해 만든 프리미엄 건강 간식이다. 동원F&B는 국내 최초로 횟감용 참치를 넣어 만든 최고급 영양간식 ‘뉴트리플랜 고메트릿’을 내놨다.
사료 등급도 고급화되고 있다. 전체 사료 원료의 95% 이상(미국 농무부 기준)이 유기농인 ‘오가닉(organic)’, 반려동물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신경 썼다는 뜻의 ‘홀리스틱’,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휴먼그레이드’ 등이 있다. 다만 홀리스틱, 휴먼그레이드는 공식 기준이 아닌 업계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용어인 만큼 소비자들은 미 농무부 인증을 받은 오가닉 사료를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종복 한국마즈 부사장 겸 한국펫사료협회장은 “사료 가격이 등급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같은 용량의 최하 등급과 최고 등급 사료의 가격은)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비만 또는 피부가 약한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처방식 사료와 곡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위한 ‘그레인 프리(grain free)’ 사료 등은 또 다른 틈새시장이다. 김현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품질의 펫푸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펫푸드 산업은 점점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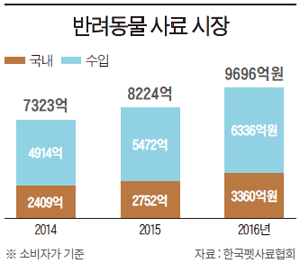
기업들도 같은 판단하에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 새로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기존 ‘제일사료’ 브랜드를 가지고 있던 하림은 지난해 ‘하림펫푸드’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펫푸드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빙그레는 최근 반려동물 관련 상표인 ‘에버그로(evergrow)’를 만들면서 반려동물용 식품·음료·영양보충제 등의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로얄캐닌코리아는 전북 김제에 6400만달러(약 690억원)를 들여 연간 9만t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김종복 협회장은 “현재 펫푸드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정도로 규모 있는 식품 기업 대부분이 펫푸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인구 성장이 정체되고 기존 내수 산업군이 시장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신성장 동력 마련이 절실해졌다”면서 “펫 비즈니스가 국내 식품 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한국 펫푸드 시장의 65%는 수입산
다만 한국 펫푸드 업계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입 사료가 고가 시장의 대부분,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펫푸드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물량 기준으로 국내 제조분이 65%, 해외 수입분이 35%였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 바꾸면 상황은 역전된다. 국내 제조분은 35%(3360억원)에 불과하고, 해외 수입분이 65%(6366억원)를 차지한다.
몰티즈 강아지 ‘자두(12세)’와 코리안숏헤어 고양이 ‘하루(11세)’ ‘봄이(2세)’ 등 세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이윤지(25)씨는 “수입 브랜드 사료가 국내 브랜드에 비해 훨씬 더 비싸지만 아이들(강아지들)의 몸을 생각하면 수입 브랜드를 살 수밖에 없다”며 “수입 브랜드는 아이들의 피부 타입·체형·몸무게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전문 사료인데, 국내 브랜드는 아직 수입 브랜드를 흉내 내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 신뢰도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브랜드 사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신뢰도는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한국엔 개를 ‘먹는’ 문화와 ‘기르는’ 문화가 공존하다 보니, 개의 건강을 위한 사료보다는 사람이 개를 먹었을 때 문제없는 사료를 만드는 쪽으로만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이다. 김종복 협회장은 “현재 개의 법적 위치가 가축과 애완 사이에 있다 보니, 사료관리법 역시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이 섭취했을 때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사료가 필요해진 만큼, 법 역시 식용견 등 농장동물과 구분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