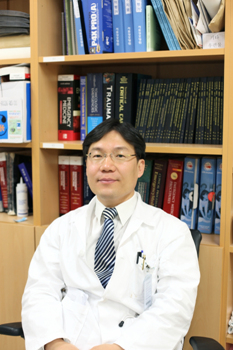
-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장 박규남 교수/서울성모병원 제공
심근 경색과 뇌졸중으로 심장박동이 갑자기 멎은 응급환자 5명 중 1명은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장 박규남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9개월간 병원 밖에서 심장이 정지돼 이송된 164명의 환자 중 23.2%인 38명이 생존해 퇴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심정지 환자 전체 생존퇴원율 2.5%(2008년 기준)보다 10배 가까이, 서울지역 생존퇴원율 4.9%보다 5배 넘게 높은 수치다.
박 교수팀은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살아난 혼수환자에게 저체온요법을 비롯한 집중치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40~50%는 자발순환이 돌아오지만 ‘심정지 후 증후군’ 때문에 숨지는 경우가 많다.
심정지 후 증후군은 ‘심정지 후 뇌손상’, ‘심근기능 부전’ 등 독특하고 복잡한 상태로 찾아온다. 이를 극복하려면 저체온 요법 등 심장소생 후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한다는 것이 박 교수팀의 설명이다. 저체온요법은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한 혼수환자들의 체온을 32~34도로 낮춰 24시간동안 유지한 후 다시 서서히 체온을 높이는 치료법이다.
박 교수팀은 “심장이 마비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며 “설사 심폐소생술로 심장활동이 살아났다해도 2차적인 뇌손상을 줄이려면 저체온요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저체온요법은 심정지를 겪은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된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박 교수팀은 강조했다.
의료기술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전체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은 5%에 못미치고 있다. 박규남 센터장은 “미국 전체 심정지 환자 생존률이 4.4%인데 비해,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의료체계 질 관리 및 병원에서의 저체온 요법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애틀은 심정지 환자 생존률이 16.3%로 높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이어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려면 우선 가족이나 주민 등 목격자들이 적극적으로 기본 심폐소생술을 해야하고, 구급대원들이 환자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시에 제세동(전기충격)을 실시해야하며, 병원에서는 저체온요법을 포함한 집중치료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교수팀은 심폐소생술과 저체온요법으로 새 생명을 얻은 환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오는 17일 ‘소중한 생명, 다시 찾은 삶’이라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

-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심정지 환자 중 자발순환이 돌아온 환자에게 저체온요법을 시행하고 있다./서울성모병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