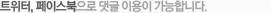J플러스의 게시물은 중앙일보 편집 방향 및 논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생가를 가다.
1818년 7월 14일.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流配)에서 풀려나 그리운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의 나이 이미 60을 바라보는 57세. 그런 나이에도 그는 고향에서 저술 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냈다. 목민심서(牧民心書)를 보완했으며, 흠흠심서(欽欽新書), 아언각비(雅言覺非) 등을 저술했다. 그의 고향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舊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다.
전남 강진의 다산초당(茶山草堂)을 다녀온 필자는 내친김에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를 다녀왔다. 강변북로-덕소-팔당댐-다산 유적지로 이어지는 길은 많은 차량들로 인해 가다 서다를 반복한 지루한 흐름이었다. 그래도 '선생의 삶을 재(再)조명해본다'는 점에서 짜증이 나질 않았다.

다산유적지 입구-전면의 건물이 다산문화관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인지 다산 유적지의 주차장에는 관광버스와 승용차들이 가득했다. 필자가 차에서 내려 문화관 쪽으로 발길을 옮기자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동판으로 새겨진 글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다.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청심(淸心)'과 '용인(用人)'
"청렴은 수령의 본무인데,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수령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아첨(阿諂) 잘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간쟁(諫諍: 국왕의 과오나 비행을 비판하던 사람)하기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 점을 잘 살피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청심(淸心)'과 '용인(用人)'이다. 사람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읽어보라는 뜻에서 만든 듯싶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였다.
요즈음 수령(?)들의 청렴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들 모두에게 목민심서를 다시금 권하고 싶다. '용인(用人)'도 같은 개념이다. 리더들은 다소 거슬릴지라도 아첨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문화관 입구에 있는 다산의 저술-
문화관에 들어서자 선생이 저술한 책의 목록들이 쓰여 있었다. 제목만 적혀져 있는 데도 카메라 렌즈에 다 담을 수가 없었다.
다산, 회합(滙合)의 삶

다산 정약용 선생 상(像)
회합(滙合)- 다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다. 선생의 삶은 물(水)줄기처럼 돌고 돌아 흘러서 다시 모이는 인생살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다산은 여생(餘生)을 '새로운 조선의 발견'에 초점을 맞췄다. 다산 문화관은 그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다산은 충주·춘천 등으로 배를 타고 한강을 여행하며 조선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다산은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실증적으로 연구했다. 우리 문화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문화권과 열수(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 문화권으로 구분된다'는 학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선생의 학설은 자연스럽게 문학으로 확대됐다. 조선인이면 조선의 시(詩)를 써야 한다는 현실주의 문학론의 실천을 이룩했던 것이다.>
"늙은이의 한 가지 통쾌한 일은
붓 가는 대로 아무 말이나 쓰는 것일세.
어떤 운자(韻字)에도 얽매이지 않고
퇴고(推敲)를 더디 해도 상관이 없네.
(....)
나는 조선 사람인지라
즐거이 조선 시(詩)를 짓는다네."
선생의 대표적인 시(詩) '노인일쾌사 6수(老人一快事六首)'다. 71세인 자신의 모습과 일상의 이야기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읊은 시였다(다산 정약용 평전/박석무). 필자 역시 '나는 조선 사람인지라 즐거이 조선 시(詩)를 짓는다네'에서 선생의 현실성이 느껴졌다.
유배지에서 그리운 고향 마현

유배지에서 그리운 마현-
선생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얼마나 고향과 가족들이 그리웠을까. 유배 시절 다산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기억을 더듬어 고향 마현을 직접 그려서 다산초당에 걸어두었다. 덧없는 세월-산천은 물론 아내와 자식들, 친척,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또한 컸을 것이다.
그토록 그리운 고향에 돌아온 다산은 경학(經學) 연구에 몰두했다. 경학의 연구를 보다 체계화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학술 교류를 확대했던 것이다.
다산은 이미 알려진 대로 실학을 집대성함은 물론, 정치·경제·역리·지리·문학·철학·의학·교육학·군사학·자연과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학문 탐구에 대한 열정이 하늘을 찔렀음이다.
다산 유적지에 전시된 대로 기중기와 배다리에 설계에 대한 탁월한 능력은 시대를 앞선 능력자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新)발명품이었다.

배다리 모형-배다리의 왼쪽에 여유당이 있다.
선생은 28세의 나이에 용산과 노량진 사이의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다리 설계에 참여해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해서 정조 대왕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건설한 수원화성의 설계자가 정약용 선생이었다. 그는 학자의 범주를 넘어 과학도 이기도 했다.
붐볐던 여유당(與猶堂)과 영면(永眠)

선생이 잠든 묘지에서 내려다 본 여유당
"여(與)- 겨울의 냇물을 건너는 듯하고, 유(猶)-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 하라."
선생의 당호(堂號)인 여유(與猶)는 정조 24년(1800년) 봄,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었단다. 선생의 생가 여유당(與猶堂)은 단아한 한옥이었다. 필자는 여유당 입구에 쓰여 있는 안내문을 읽고서 다소 실망했다.
<생가 여유당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유실되었던 것을 1986년 복원한 것으로, 집 앞으로 내(川)가 흐르고, 집 뒤로 낮은 언덕이 있는 지형에 자리 잡고 있어 선생은 수각(水閣)이라고도 표현하였다.>
아무튼, 여유당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집안의 이곳저곳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비록 복원된 집이라고해도 선생의 200여 년 전의 삶이 아스라이 연상됐다.

여유당서 집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본다. 1830년 69세의 노인 다신이 거처하던 여유당은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정조 대왕의 사위인 홍현주를 비롯해, 당대의 문사 이만용 등이 다산과 학문을 논(論)하면서 시를 지었다(다산 정약용 평전).
다산은 1836년 2월 22일(음력) 75세의 나이로 생(生)을 마감했다. 억울한 생(生)이기도 했으나, 학문의 대업을 이룩한 의미 있는 삶이기도 했다. 선생은 공교롭게도 결혼 60주년이 되는 날 이승을 떠났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를 예견한 듯 '영면 직전에 지었다'는 '회혼(回婚)의 시(詩)'가 가슴을 저민다.
"육십년 풍상(風霜)의 세월 눈 깜짝할 사이 흘러가
복사꽃 활짝 핀 봄 결혼 그해 같네.
살아 이별 죽어 이별이 늙음 재촉했으나
슬픔 짧고 기쁨 길었으니 임금님 은혜에 감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