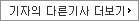다 쓰러져 가는 전각 하나만 있던 군위 법주사를 선원까지 있는 번듯한 도량으로 가꾼 육문 스님. 몇 해 전 한쪽 눈을 실명해 선글라스처럼 보이는 보호 안경을 쓰고 있다. 참선 공부와 일상에서 부처님 제자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온 비구니계의 호랑이 스님이다. 군위=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다 쓰러져 가는 전각 하나만 있던 군위 법주사를 선원까지 있는 번듯한 도량으로 가꾼 육문 스님. 몇 해 전 한쪽 눈을 실명해 선글라스처럼 보이는 보호 안경을 쓰고 있다. 참선 공부와 일상에서 부처님 제자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온 비구니계의 호랑이 스님이다. 군위=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그 호랑이는 최근 6000여 명의 조계종 비구니를 대표하는 전국비구니회장으로 취임한 육문 스님(69)이다. 경북 군위 법주사에서 만난 스님은 10·27 때 사연을 얘기하다 “현실이나 참선 중 만나는 생사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했다.
○ “사자는 제 몸에서 벌레가 나서 죽어”
육문 스님의 행보가 관심을 끄는 것은 비구니계뿐만 아니라 종단 전체에 불어올 새바람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비구니들은 종단 소속 스님의 절반이 넘지만 종단 행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본사 이상의 주지는 맡을 수 없고, 종단의 국회 격인 80여 석 중앙종회에도 10석만 비구니 몫으로 할당돼 있다.
스님은 “50, 60년 ‘중 생활’ 해도 비구니라는 이유로 본사 주지가 될 수 없으니 말이 되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스님은 이어 “팔경계(八敬戒·계를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노비구니도 어린 사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등 비구니가 지켜야 할 8가지 조항)나 들이대는 것은 쫀쫀한 소리”라며 “젊은 비구니들 중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 세상이 바뀌지 않겠냐”고 말했다.
스님은 이런 비유도 했다. “사자는 누가 죽이는 게 아니라 살생과 욕심을 내다 제 몸에서 벌레가 나서 죽어. 최근 불교가 사회에서 욕을 먹는 것은 수행자들이 본연의 자세를 못 지키기 때문이야.”
○ “윗사람이 잘 살아야”
한 상좌가 내준 송차 한 모금을 삼킨 사이 스님의 시계는 50여 년 전으로 돌아갔다. 16세 소녀가 길에서 나중에 은사가 되는 성태 스님을 만났다. 조카의 죽음 등을 지켜보며 삶의 무상함을 느낀 소녀는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은사는 “네 마음이 정한다. 절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했다. 이듬해 소녀는 집에서 멀지 않은 사찰을 찾아 출가했다. 독실한 불자이지만 6남매 중 어린 막내딸을 보낼 수 없었던 부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절을 찾았지만 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 길로 ‘중노릇’ 한 게 지금까지네. 절에 처음 와 보니 밭이 6000평이야. 별을 보고 나가면 별 보고 들어와야 했어. 진짜 말 그대로 주경야독했지.”
스님은 “앞사람이 잘 살아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며 “내 눈에 귀한 자식, 남의 눈에는 가시니 더 잘 가르쳐야 한다”며 평소 좋아하는 서산대사의 시 한 구절을 읊었다.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오늘 내가 걸어간 이 발자국은 뒤에 오는 다른 사람의 길잡이가 된다).’
군위=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