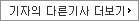부형권 뉴욕 특파원
부형권 뉴욕 특파원1978년 남편(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칸소 주지사 선거 운동을 도우며 본격적으로 세상의 여자들을 만난다. 1920년 이미 여성 참정권이 실현됐지만 “정치는 몰라요. 남편이 대신 투표해요”라고 말하는 여성 유권자가 적잖았다. 그가 ‘힐러리 로댐’이란 결혼 전 성(姓)을 그대로 쓰는 걸 불쾌해하는 여성도 많았다. 이런 압력 때문에, 그리고 남편의 주지사 재선을 위해 1982년 그는 ‘힐러리 로댐 클린턴’이 됐다.
1999년 가장 힘든 두 가지 결정을 동시에 내려야 했다. 이른바 ‘르윈스키 스캔들’로 국민까지 속인 남편과 계속 살 것인가. “뉴욕 주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라”는 당의 권유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혼은 하지 않고, 출마는 하기로 결정했다. 훗날 “내가 빌을 용서한 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늙어가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출마 결심은 뉴욕의 한 모임에서 만난 젊은 여자 운동선수들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격려가 결정적이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여자들에게 경쟁을 겁내지 말라고 말해 왔다. 그런 내가 경쟁을 두려워해도 되느냐’는 자각이었다. 두 결정은 전혀 다른 이유와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정치적 출세를 위해 부정한 남편조차 끌어안은 무서운 여자’라는 시각이 있었다.
2016년 대선 가도에서 만난 가장 큰 난관이 경쟁 후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75)에게 80% 이상 몰표를 안기는 20, 30대 젊은 여성이란 점은 그에겐 분명 아이러니다. 결혼을 2번, 3번씩 한 남자 후보들에겐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했느냐’는 비판이 거의 없지만 그에겐 ‘왜 이혼하지 않았느냐. 페미니즘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뒷말이 떠나지 않는다. 그는 “최초의 여성(할머니) 대통령이 돼 내 딸, 내 손녀가 남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친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은 “여성은 여성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섹시즘(성차별주의)”이라고 반박한다. 뉴욕타임스(NYT)는 “페미니즘 운동가들의 오랜 투쟁 덕분에 요즘 여자 아이들은 성차별을 거의 안 느끼며 자란다. 오히려 대학 학자금 빚, 좋은 일자리 부족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그들에겐 더욱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페미니즘 세대 갈등이다.
백악관 유리천장을 깨려는 ‘할머니 힐러리’가 설득해야 할 마지막 대상은 21세기의 ‘여대생 힐러리’들인지 모르겠다. 그들은 47년 전 두려움과 신뢰의 파탄을 역설했던 힐러리 자신과 본질적으론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