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한의 황제 유비는 자신의 수석참모인 제갈량을 두고 “나에게 공명(孔明)이 있음은 물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수어지교(水魚之交)라는 고사성어를 유래한 이 말은 보스와 참모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물은 물고기 없이는 의미를 실현할 수 없듯이, 보스와 참모는 진정한 한 팀이 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이 연재에선 한 팀을 이루는 바로 그 과정에 주목한다. 어떻게 보스를 선택하고 참모를 선택하는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역사 속의 사례로 살펴본다.

이이의 직언에 불편한 심기 감추지 않아
이러한 이이가 선조는 거슬렸던 것 같다. 틈만 나면 민생이 파탄이 났고 정치가 어지럽다며 임금의 반성을 요구해대니 그의 말이 곱게 들릴 리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선조는 ‘이이가 경연 석상에서 임금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주 올리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재상인 노수신이 이이를 중용 하라고 건의했을 때에도 “크게 쓸 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의 언론에는 과격한 점이 많다”며 마땅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다(선조 8년 6월 1일). 심지어 이이가 사직을 청하자 “인간사를 떠나 푸른 소나무를 벗 삼으며 은거하겠다니 즐겁겠구나!”라고 비꼬았으며(선조 7년 3월 1일), 그를 한나라 때의 학자 가의(賈誼)에 견주며 “가의는 글을 읽어 말만 잘할 뿐이지 실지로 쓸 만한 재주가 아니었으니, 문제(文帝)가 그를 쓰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한 적도 있다(선조 9년 2월 1일).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이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선조는 그에게 계속 관직을 제수했다는 점이다. 사림의 존경과 신망을 받았고 역량과 자질 또한 뛰어난 그를 선조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이가 “전하께서 신을 쓰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하문하소서. 그리하여 신의 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는 신을 부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선조의 부름은 형식적이었을 뿐 이이를 제대로 쓰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 실록은 “상(임금)이 이이의 충성스런 바른 말을 매우 가상히 여긴다고 답하였으나 (이이의 간언을) 채택하여 사용한 실상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선조 11년 5월 1일). 특히 이이가 사직상소를 올리기라도 하면 선조는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수리해버렸다.
이후에도 선조는 이이의 상소가 잘못되었다며 해임을 명했고(선조 12년 5월 1일), 노수신이 “신이 이이를 거두어 등용하기를 주청한 것이 여러 번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분부를 내리지 않고 계시니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라고 묻자 “이이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다. 내 나이가 아직 젊고 그 사람 역시 늙지 않았는데 조금 늦는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대답하는 등(선조 12년 7월 1일) 여전히 이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이이도 선조에게 실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날 유성룡이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적이고 장구한 계책에 대해 묻자 그는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아래로는 조정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장구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선비들을 경시하고 속된 무리들을 신임하고 계시니 무슨 일인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답했다고 한다(선조 14년 4월 1일).
그런데 1582년(선조15)에 즈음하여 선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이를 이조판서에 임명해 인사권을 맡기고 이이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선조 15년 1월 1일). 이이가 병조판서를 맡았을 때 임금에게 무례했다며 탄핵을 받자 “이이가 전부터 시류에 영합하며 당(黨, 동인과 서인)에 아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일으키는 폐단을 지적해왔기 때문에 저들의 미움을 받아온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 이이의 실수가 있게 되자 이 기회를 틈타 탄핵해 그를 제거하려 드는 것이다”라며 이이를 강력히 옹호했다(선조 16년 6월 1일). 그는 이이가 탄핵을 이유로 사직하자 “경이 출근하지 않아 병무가 마비되었을 뿐 아니라 나랏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며 거듭 출사를 종용한다. “어찌하여 경과 같은 인물이 시대의 뜻을 얻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탄식하며(선조 16년 9월 1일) 이이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문책하고 이이를 지지하는 상소에 대해서는 극찬하기도 했다.
성혼이 이이를 옹호하자 두 사람을 함께 비판하는 상소들이 쏟아졌는데 이를 두고 선조가 격노하며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를 이이·성혼의 당이라고 부르도록 하라. 그래도 다시 할 말이 있는가? 이이·성혼을 헐뜯는 자는 반드시 죄를 내리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이에 대한 선조의 태도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선조 16년 9월 3일).
선조의 중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이 세상 떠나
무릇 인재는 알아보기도 힘들지만 제대로 쓰기도 어려운 법이다. 인재를 담을 만한 도량을 가지지 못한다면 인재는 그저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만약 선조가 이이가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도, 자신에게 맞서 신랄한 비판을 해도 참고 수용해 그를 중용했더라면 어떠했을까? 당대의 준마(駿馬)가 병들어 쇠약해지기 전에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이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참화를 겪었음을 생각할 때 더욱 아쉬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김준태 - 칼럼니스트이자 정치철학자. 성균관대와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와 동양철학문화연구소를 거치며 한국의 정치철학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 역사 속 정치가들의 리더십과 사상을 연구한 논문을 다수 썼다. 저서로는 [왕의 경영], [군주의 조건] 등이 있다.
김준태 칼럼니스트이자 정치철학자


![[김준태의 보스와 참모의 관계학(26) 그림자 참모 ‘상선(尙膳)’] 때론 왕까지 흔든 ‘문고리 권력’](http://ir.joins.com/?u=http%3A%2F%2Fpds.joins.com%2F%2Fnews%2Fcomponent%2Fhtmlphoto_mmdata%2F201708%2F19%2Fc28d59eb-6794-41b3-87d1-9cae513ac370.jpg&w=212&h=140&t=c&bg=ffffff)
![[김준태의 보스와 참모의 관계학(27) 명종과 영의정들] 일할 여건 만들지 않은 명종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신하](http://ir.joins.com/?u=http%3A%2F%2Fpds.joins.com%2F%2Fnews%2Fcomponent%2Fhtmlphoto_mmdata%2F201709%2F03%2F3fa04008-5865-473f-a97b-07851f745fe5.jpg&w=212&h=140&t=c&bg=ffffff)
![[주목받는 일본 협동로봇] 사람과 함께 설거지하고 호텔 체크인 도와](http://ir.joins.com/?u=http%3A%2F%2Fpds.joins.com%2F%2Fnews%2Fcomponent%2Fhtmlphoto_mmdata%2F201708%2F13%2Fc3423fd7-11d3-4d27-85eb-564aa9d2f411.jpg&w=212&h=140&t=c&bg=ffff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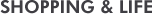










전체댓글2
게시판 관리기준
- 조인스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알림] 소셜 로그인을 활용해 손쉽게 의견을 작성해보세요.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픈 댓글 서비스입니다.
- dant**** 2017-09-10 13:02:37 신고하기
댓글 찬성하기1 댓글 반대하기0조선은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 때, 이미 망한 나라다.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임금이 있는가 알아보라.
답글달기- Hyun**** 2017-09-10 12:47:19 신고하기
댓글 찬성하기1 댓글 반대하기0선조는 또.라이 중 또.라이였다. 전쟁중에도 오로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골몰했고, 심지어 이순신 같은 영웅도 자기 권력에 도전할까봐 감옥에 보냈고, 전쟁중에도 여러번 왕권을 양위하고 물러나겠다고 쑈를 벌여서 여기에 찬동하는 자들을 족쳤다. 한마디로 나라는 망해도 좋으나 권력은 못놓겠다는 자세였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 왕이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왕들도 대체로 비슷한 자세로 왕노릇을 했으니 19세기 말 일본이 들어올때까지 나라가 유지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답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