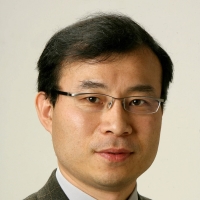[대한제국 120주년] 다시 쓰는 근대사 <4> 단발령과 항일 의병
![대한제국 창건 전후의 의병은 대부분 고종의 거의(擧義) 밀지를 받고 움직였다. 정규 훈련을 받은 국군과 민군(民軍)이 항일 연합 작전을 펼쳤다. 사진 속 검은 제복을 입은 인물이 국군, 무명옷을 입은 이들은 민군이다. 1906년 무렵 영국 출신 언론인 메킨지가 찍었다. [중앙포토]](http://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709/10/a1114707-aef3-4b6b-9ad5-5d17589e683b.jpg)
대한제국 창건 전후의 의병은 대부분 고종의 거의(擧義) 밀지를 받고 움직였다. 정규 훈련을 받은 국군과 민군(民軍)이 항일 연합 작전을 펼쳤다. 사진 속 검은 제복을 입은 인물이 국군, 무명옷을 입은 이들은 민군이다. 1906년 무렵 영국 출신 언론인 메킨지가 찍었다. [중앙포토]
길 가는 사람 강제로 상투 잘라
왕후 살해 소식 겹치며 분노 폭발
고종 擧義 밀지에 일제히 봉기
‘의병=자발적 民軍’ 개념은 오류
1894년 후 임금-백성 ‘연합 항전’
아관망명 직후 ‘두발 편의령’ 공표
단발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무력 앞세운 일제 강압성 거부
‘개화에 역행’ 시각은 일제 왜곡
백성들은 왜 그렇게 머리 깎는 일에 분노하며 저항했을까. 안타깝게도 그 전후 맥락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요즘의 시각으로 희화화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소위 ‘개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비아냥이다. 1894년 7월 일제의 침략(갑오왜란)에 맞선 동학농민군의 재봉기를 보수적이고 반(反)근대적 저항으로 폄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895년의 단발령에 대한 의병봉기도 반근대적 저항으로 때론 은근히, 때론 노골적으로 비웃는 시각이 우리 역사학계에 많다. 과연 단발령에 대한 저항을 그렇게 비하해도 좋은 것일까.
나라 전체가 물 끓는 솥같이 들끓어
이렇게 무단(武斷)으로 강행한 단발령은 훗날 창씨개명 강요에 버금가는 ‘정체성 말살’의 폭거였다. 일제와 친일 개화파들은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멸시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개화론’을 따르는 그들은 조선을 미개(야만) 혹은 반(半)개화 상태로 파악하며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흔히 단발령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할 때 일부 위정척사파 유학자들의 사례를 들곤 한다. “내 몸의 털과 살(身體髮膚)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고 한 『효경』의 가르침에 따라 단발령에 저항했다는 것이다. 위정척사파 유생들 중에는 최익현·유인석 등 소수가 실제 그런 논변을 구사하며 단발에 반대했다. 하지만 『효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조선의 ‘상투’와 ‘망건’은 『효경』은 물론이고 어느 유교 경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고려와 조선이 섬긴 유교국가 송·명조의 전통에도 없다. 무엇보다 당시 백성들이 위정척사파 유학자처럼 서양문물 수용을 그렇게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548~560쪽)
당시 백성들은 단발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친일파 윤치호가 남긴 기록에서도 그런 점이 확인된다.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의 통역인 송씨의 말이라며 윤치호는 이렇게 적어 놓았다. “나 자신이나 다른 조선인은 단발에 반대하지 않지만 일본인들이 단발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반대한다.”(『윤치호 일기(4)』 1895년 12월 28일자) 당시 군부대신 이도재가 단발령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대신직을 사임하며 올린 상소문도 같은 의견이었다. “우리나라는 단군과 기자 이래로 편발(編髮)의 풍속이 상투의 풍속으로 변해 머리칼을 아끼는 것을 큰일로 여겼습니다. … 옛적에 청인(淸人)들이 북경에 침입해서 무기를 사용해 관면(冠冕)을 위압으로 훼손하니 쌓인 울분이 300년간 풀리지 않아서 발비(髮匪·머리를 길게 기른 비적)가 일어나 … 수십 년간 병력을 써서야 겨우 평정했습니다. 이것이 족히 교훈이 됩니다. 그것이 진실로 나라에 이롭다면 신(臣)은 비록 으깨져 추방된다고 해도 굳이 이 자리를 사양치 않을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감히 한 줌의 짧은 머리터럭을 아껴 국계(國計)를 위하지 않겠습니까?”(『고종실록』 1895년 음력 11월 16일) 유생 이도재는 상투를 유교의 『효경』과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단군 이래 수천 년 우리 민족의 풍속과 연결시켰다. 그러면서 자발적 단발이라면 “한 줌의 짧은 머리터럭을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무력을 동원한 강제 단발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강제 단발에 대한 반대에서는 유생이나 영어를 배운 신식 지식인이나 의견이 같았던 것이다.
![단발령이 내려오자 백성들은 정신적 굴복까지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저항했다. 상투를 자르느니 차라리 스님처럼 깎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http://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709/10/6014e3de-5198-42e6-909d-22a16a5419a3.jpg)
단발령이 내려오자 백성들은 정신적 굴복까지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저항했다. 상투를 자르느니 차라리 스님처럼 깎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
단발에 대한 저항의 역사는 오래됐다. 고려는 몽골에 패배했음에도 단발은 거부했고, 결국 실랑이 끝에 원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냈다. 만주족이 조선과 명나라를 정복하고 심복(心服)의 표시로 치발역복(髮易服:만주식 변발과 의복)을 강요했을 때도 한족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조선인은 끝내 거부해 ‘조선은 상투와 백의(白衣)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청국 황제의 승인을 받아냈다.
왕후 없애고 ‘조선 정복’ 종결됐다고 판단
역사는 일제와 친일파들의 탐욕대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단발령에 대한 분노에다 왕후 시해에 대한 복수심까지 더해지면서 의병 봉기는 거족적으로 전개됐다.
항일 의병 관련 새로운 연구를 주목해야 한다. 2000년을 전후해 고종과 의병의 밀접한 관계가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1894년 동학농민군 2차 항일봉기 이후의 의병은 대체로 고종의 거의(擧義) 밀지를 받고 움직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고종 신경망 별입시, 친일파에겐 눈엣가시
이런 별입시가 일제와 친일파들에게는 눈엣가시였다. 친일파 윤치호와 독립협회는 수많은 기사로 별입시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면서 퇴척을 요구했다.(『독립신문』, 1898년 7월 30일, 8월 3일, 8월 16일, 9월 17일, 9월 21일 등)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의병 봉기와 고종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됐다. 의병은 대개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군(民軍)으로만 여겨졌다. 이 같은 의병 개념에 큰 영향을 끼친 이는 박은식(1859~1925)이다. 박은식은 저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의병이란 민군인데, 국가가 위급할 때 의리로 일어나 조정의 징발령을 기다리지 않고 종군을 한, 적개심에 불타는 사람들이다”고 규정했다.(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 2008, 71쪽)
박은식의 의병 개념은 이제 수정되어야 한다.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의병운동은 박은식의 개념에 따른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재야세력만의 자발적 민족운동이 아니라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의 합작품이었다.(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17~61쪽) 친일파 박영효를 추종하며 고종의 무능을 비판했던 정교조차도 “이(아관망명)에 앞서 각처 의병은 모두 밀칙(密勅)을 받고 일어났다(先是各處義兵 皆受密勅而起)”고 기록하고 있다.(정교, 『대한계년사(2)』, 소명, 2004, 160쪽) 밀지를 받지 않고 봉기한 소규모 의병이 있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엔 밀지를 받은 대규모 의병부대에 통합됐다.
박은식, 친일파 소굴 독립협회 치켜세워
고종과 백성의 ‘연합 작전’이 있었기에 아관망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 아관망명 다음날인 2월 12일 고종은 일제의 단발령을 취소시켰고, 18일 ‘두발 편의령’을 발표했다. 임금과 관리, 그리고 군인들의 이미 깎인 머리는 그대로 두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두발 형태를 각자의 편의대로 하라고 했다. 머리카락의 길고 짧음이 근대화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설사 근대화를 위해 단발이 필요했다고 치더라도 신체적 프라이버시의 자유를 말살한 ‘강제 단발령’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 ‘두발 편의령’ 가운데 어느 것이 근대적 조치인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자문 전문가와 기관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황태연 동국대 교수, 서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 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국관
참고자료 『고종황제와 한말의병』(오영섭·선인·2007), 『갑오왜란과 아관망명』(황태연·청계·2017),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인』(김문자·태학사·2011), 『미래를 여는 우리 근현대사』(한영우·경세원·2016), 『동경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이태진·태학사·2005), 『용연 김정규 일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경인문화사·1994), 『매천야록』(황현·명문당·2008), 『오하기문』(황현·역사비평사·1994), 『대한계년사(2)』(정교·소명·200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사벨라 버드 비숍·살림·1994)
배영대 문화선임기자 balanc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