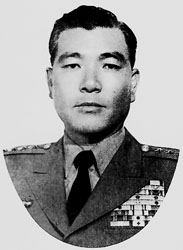'그때 그 이야기 > 장군이 된 이등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2話 장군이 된 이등병<248>PX 문화를 정착시키다 (0) | 2009.05.20 |
|---|---|
| 제2話 장군이 된 이등병<247>PX물품은 불량품에 高價-142- (0) | 2009.05.20 |
| 제2話 장군이 된 이등병<245>이등병이 장군 되다 -140- (0) | 2009.05.20 |
| 제2話 장군이 된 이등병<244>고생한 장교들 그러나…-139- (0) | 2009.05.20 |
| 제2話 장군이 된 이등병<243> 기존 인사 규정 하자 투성이-138- (0) | 2009.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