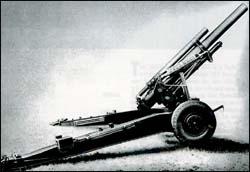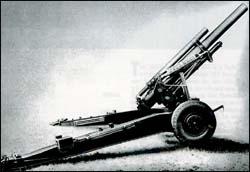
4·19 학생의거는 나의 인생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청 앞에 계엄군이 진주해 전차가 삼엄한 경계태세에 들어갔는데도 시민·학생들이 전차에 올라타 국군 만세를 외치고, 군의 엄정중립을 연호하는 구호를 보면서 어떤 자부심과 함께 착잡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1군 사령부(사령관 이한림 중장·군영·전 건설부장관) 예하의 포병부(부장 정봉욱 대령·인민군 귀순·7사단장·소장 예편)에 소속된 나는 맨 먼저 1군의 각 화포 D/L(정비불량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포)이 40%에 달한다는 미 고문단의 지적을 받았다. 화약 컨트롤 시스템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화포는 못쓰게 되는데 100대 중 40대가 버려야 할 것들이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임무가 D/L을 10% 이내로 감소하는 일이었다.
나는 매일 먼지 풀풀 날리며 1군 각 포대를 돌며 점검과 수리·수선으로 6개월을 보냈다. 누구도 녹슬고 망가진 화포를 수리·수선하는 일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면 더 일하기가 싫어지고, 그것은 당사자가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요령 피운다고 회피되는 일도 아니어서 억지로 즐겁게 생각하며 작업에 매달렸다. 그 결과 5%로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일이 끝날 무렵 갑자기 1군 101포병대대장으로 전속 명령이 났다. 장교들이 대대장 명령에 항거하는 ‘반란사건’이 일어나 상부로부터 강력한 지휘를 하도록 나를 보낸 것이었다. 정봉욱 포병부장은 “대대를 철저하게 장악하라”고 지시했다.
전임 대대장은 사람이 좋아 장교나 병사들에게 허약하게 비치고, 이로 인해 대대장 지시가 먹혀들어가지 않았던 모양이다. 역시 사람만 좋아서는 놀림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전 장교들을 집합시킨 뒤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동안 두 군데의 대대장을 한 사람이다. 대대장의 모든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을 평가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이를 석달 후 발표해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하고 대대의 동태를 살피니 정말 내부 질서가 엉망이었다. 그래서 장교들부터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또 신철원쪽으로 신 진지를 구축해 나가면서 어려운 일은 내가 맡았다. 삽질은 농촌출신으로서 몸에 밴 일 아닌가. 지휘자는 인정만 많아도 안 되고, 엄함과 따뜻함, 그리고 솔선수범해야 따르게 된다.
어느 날 5군단장 박임환 중장(군영·1군 사령관·중장 예편)이 대대장 CP를 찾았다. 갑자기 찾아온 군단장이 “단기간내 진지를 구축하고, 대대 군기를 잡았다는데 점심이나 얻어먹고 갈까” 하고 나를 격려했다. 점심을 막 들려는 순간 밖에 있던 전속부관이 천막으로 급히 들어왔다.
“군단장님, 국회의원이 30분 후에 군단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군단장은 심기가 불편한 듯 얼굴을 찌푸리면서 “제기랄, 밥먹을 시간도 없네. 최중령, 미안하게 됐소”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는 “별 세 개를 달고도 국회의원한테 쩔쩔매야 하니 한심하군” 했다.
나는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러자 옆의 참모가 “군단장님보다 국회의원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한다. 나는 군단장이 쩔쩔매며 나가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국회의원의 지위를 실감할 수 있었다. 군단장이라면 감히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 아닌가. 야전에서만 맴돌면 이처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이다.
1961년 5월15일 저녁. 난데없이 포병부 정보과장인 박승옥 중령(육사 9기·사단장·소장 예편)이 부대를 방문했다. 의아스러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놀러 왔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예의 나의 동태를 살피는 것 같아 우리 부대에 또 무슨 변이 생겼나 하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님이 오면 대개 시내(신철원 지동리)로 나가 막걸리 한잔 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그는 나갈 것 없이 대대장 관사에서 한잔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흘렸다. 4·19 후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다면서 “어디 라디오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라디오도 없이 사는지라 없다고 했더니 그렇다면 무전기라도 갖다 놓으라고 했다.
<이계홍 용인대 겸임교수·인물전문기자>
200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