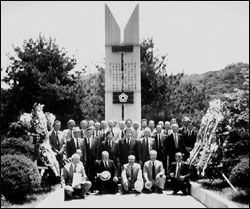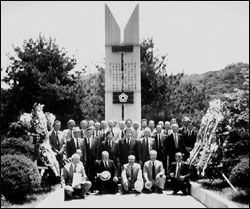
나는 서종철 참모총장에게 현지 임관 장교는 6·25전쟁 발발시 초급 장교 손실의 긴급 보충을 위해 전쟁터에서 장교 임관과 동시에 전투에 투입돼 대부분 안타깝게 희생된 군인들이라는 점을 보고했다.
6·25가 일어난 1950년 한 해만 해도 2625명이 임관해 1000명이 전사하고 1000명이 포로·실종·부상·질병으로 사라지고 600∼700명만 살아남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전쟁 초기 갈팡질팡하는 사이 전사자 유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군인묘지(현 국립묘지)에는 이들의 묘지도 위패도 없었다. 그저 원혼이 구천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군인의 최고 명예가 전사인데 유해 처리를 그따위로 하다니 그게 사실이오?”
서총장이 버럭 화를 냈다. 배석한 노재현(육사3기·육참총장·국방부장관 역임) 참모차장도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대답했다.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모두가 속수무책이고 다만 현지 임관 장교들이 총알받이로 적의 공격을 더디게 하는 수준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탓으로 군인묘지에는 묘가 없고 위패도 모셔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임 전우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구천을 헤매는 동지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추념비를 세워 매년 국군의 날에 묵념이라도 올리기 위해 성금을 모았습니다.”
서총장이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얼굴로 엄기표 부관감을 호출하더니 다그쳤다. 병적 관리에 있어 왜 현임 장교들의 전사자 처리가 아직껏 미결로 남아 있으며, 군인묘지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전사자를 방치하느냐는 호통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결재란에 서명한 뒤 추념비 건립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하라며 유재흥 국방부장관과 심흥선 합참의장 방문까지 즉석에서 주선했다.
“나라를 위해 가장 많은 전투 손실을 입은 애국자가 가장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정의 사회 구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소. 이들의 가족을 일일이 찾아 위로와 격려를 해도 부족할 판에 이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니오.”
이후 동작동 군인묘지 관리소장이 직접 나서 추념비 부지 선정은 물론 조경, 추념비 탑대 등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애석한 일은 전사자 명단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6·25가 나던 해만 해도 전사·사망, 포로·행방불명 등으로 2000명이 사라졌는 데도 전쟁 3년 동안 확인된 전사자는 800명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추념비에 명각된 전사자는 800명에 지나지 않는다.
현지 임관 출신들은 육사 출신과 달리 한 내무반에서 교육받고 동고동락한 처지가 아니다. 각 전투장에서 즉석 장교가 되는지라 출신끼리 횡적인 연대감이나 소속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정신의 핵심인 공격정신·복종정신·희생정신이 남다른 사람들이다. 병사 출신이기 때문에 직업군인정신이 투철한 반면 ‘정치군인’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당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으나 하사관(부사관) 경험을 통해 실병 지휘 능력이 뛰어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혁혁한 전공을 세운 군인이 바로 현임 장교 출신이었다는 것은 세계 전사가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경우 고급 장교 진출률이 현격히 떨어졌다.
가장 많은 희생을 감수했으면서 가장 많은 불이익을 당한 현지 임관 장교들. 그래서 우리는 1950년 8월30일 최초 현지 임관일을 기념해 매년 이날 국립현충원에 모인다. 하지만 모이는 숫자가 80∼90명선에 그치고 있다.
우리가 죽으면 후손도 없는 이 고혼(孤魂)들을 누가 보살필 것인가. 그래서 우리 현임 전우의 아들딸들이 이어 가도록 추념 행사장에 데리고 나가지만 그것이 잘 될지는 미지수다.
부모 제사도 잘 모시지 않는 세상인데….
〈이계홍 용인대 겸임교수·인물전문기자〉
2004.12.11 |